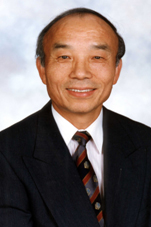
추석날 아침이다. 사람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이야 제 각각이겠지만 “추석” 하면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추억으로 가슴 가득할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 좋은 추억이고 보면 추석은 분명 즐거운 명절이다. 멀리 떠나온 유년 시절의 고향으로 내마음을 띄워 보내 본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고향 마을을 둘러 싼 나즈막한 산들이 보인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벼 이삭들이 바람 따라 황금물결 치고, 참새들은 떼를 지어 이 벌판 저 벌판을 분주히 날아다닌다.
햇빛에 반짝이는 초록 잎새 사이로 주홍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사립문 밖의 늙은 감나무는 한 폭의 수채화다. 아직도 덜 익어 벌어지지 않은 채 매달려 있는 밤송이들은 또 얼마나 우리들의 애간장을 태우는지 모른다.
마루 위에 차려놓은 제사상 위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준비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 축담 밑 마당에 멍석을 펼치고 아직도 따스한 늦여름의 아침 햇살을 뒷머리로 받으면서 조상 님들의 영전에 재배하기를 기다린다.
“자, 절 하자”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경건하게 큰절을 하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앞을 가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평상시에는 뛰놀기에 바빠 엄마 생각도 자주 못하고 지나지만 제사상 앞에 서서 그 간절한 사랑을 더듬어 보고 명복을 비는 순간만큼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꿈에서도 보고 싶지만 자주 보이지를 않는 어머니의 얼굴이 제사상 뒤에 펼쳐진 병풍 위로 보이고 자상하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 기쁨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다.
아버지는 음복하시고, 제사상을 치우시라 하신다. 하도 오래되어 잿빛으로 변한 울퉁불퉁한 초가집 좁은 마루에 온 식구가 정답게 둘러앉는다. 그러나 돌아가신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지 모두 다 별 말이 없이 묵묵히 아침상을 받는다.
평소에 먹지를 못하던 쌀밥에 탕숫국을 조금 붓고 이것저것 푸른 나물 마른 나물들과 뺄 수 없는 고사리 나물을 넣어서 탕숫국 비빔밥을 만든다. 그 비빔밥을 한 숫갈 입에 넣고 찐 생선 조각을 보태어 먹으니 그 좋고 흡족한 맛에 조금 전에 보았던 어머님의 생각마저 사라져 버린다.
이어서 따가운 늦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온 가족이 성묘길에 나선다. 이것저것 제상에 올랐던 문어 과일 등 마른 음식들을 바구니에 넣고, 추석에 쓰려고 쌀로 마련한 청주 한 병을 들고 뒷산으로 오른다. 길 섶에는 들국화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밭 가에는 가냘프게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잎이 애잔하다.
먼 산에서 구슬프게 들려오는 뻐꾸기울음이 즐거운 추석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대로 싫지 않게 들린다. 산을 올라오면서 이마에 맺은 땀방울이 산 위의 산들바람에 불려가면서 시원함을 더해준다. 이곳은 할아버지 산소라 하시면서 그분 생전의 좋은 모습들을 손자에게 알리려고 아버님께서 애를 쓰신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나름대로 할아버지를 그려보고 상상하여 본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갖고 온 음식을 묘 앞에 차려놓고 청주 한 잔 부어 놓으시면서 우리들에게만 “자, 절해라” 하신다. 재배하면서 나는 또 흐느껴 운다. 흐려진 시야 저 편으로 어머니의 웃으시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옆에서 묵묵히 서 계시는 아버지도 일찍 사별한 아내 생각에 가슴으로 울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각자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서 별 말 없이 산을 내려온다. 저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이 한결 구슬프게 들린다.
새 옷이라곤 고작 일년에 두 번, 설과 추석에 한 벌씩을 받아 입었던 참으로 가난하던 시절이다. 며칠 전 시골 장터에서 사 와서 아직도 주름들이 빳빳이 살아있는 푸른색 새 셔츠를 입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담장이 넝쿨로 뒤덮인 돌담 옆 골목길을 어설렁거리면서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동네 어른들께 “진지 드셨습니까” 하면서 추석인사를 하면 “응 그래, 좋은 옷 하나 얻어 입었구나” 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양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기쁘다.
새 옷 얻어 입고 한껏 멋을 부린 동무들이 약속도 없으면서도 이 집 저 집에서 나와 동네 앞 정자나무 밑에 모인다. 기쁘고 들뜬 마음에 모두들 밤 따러 가자고 한다. 몇 그루 되지 않는 큰 밤나무 중 올라가기 쉬운 것을 서로 골라서 막대기 하나씩을 들고 나무를 오른다.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밤송이를 막대기로 때려 몇 송이를 떨어트리고 밤나무에서 내려온다.
신발로 가시가 돛인 밤송이 한쪽을 누르고 뾰족한 막대기 끝으로 밤송이를 열어서 밤알을 들어낸다. 아직도 여물지 않는 밤 껍질을 이빨로 벗기고 떫고 얇은 껍질도 앞 이로 긁어내고 나서 밤을 먹는다. 아직 익지를 않아 밤의 구수한 맛은 없지만, 어린 밤을 서로 보라는 듯이 입 벌리고 씹으면서 그 달콤한 맛을 서로 자랑한다.
즐거웠던 유년 시절의 추억에 빠져 있다가 문득 정신을 가다듬으니 추석날 아침 제삿상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얼굴을 붉힌다. 아들 없이 돌아가신 장인 모님을 위하여 사위인 내가 추석 차례를 모시고 있는 중이다. 수륙 수 만리 밖에서 서양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식들이 오지를 않으니 제사는 언제나 우리 둘이서 모신다.
정아(처의 이름)가 정성스레 마련한 가지가지의 음식들과 와인 두 잔을 제상 위에 차려놓고, 제사의 격식이야 잘 모르지만 두 분의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생전의 모습을 더듬어 본다. 그분들의 고마우심을 생각하면서 “저승에서 두 분이 재미있게 사십시오” 하고 명복을 빈다. 마지막 재배를 하고 일어서면서 나도 모르게, “나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하면서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얕게 응얼거려본다.
또 다시 옛생각을 하면서 밥에 탕숫국을 넣고 그 위에 이것저것 나물을 얹어 비빔밥을 만들고 제상에 올렸던 와인 한 잔을 음복하며 늦은 아침을 즐긴다. 그러나 어릴 적 고향에서 먹었던 그 맛은 찾을 길이 없다. 매년 하는 대로 고향에 계시는 형님들과 누님, 홀로 계시는 형수님들에게 전화를 올리고 즐거운 추석을 맞으시라고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늘 건강하세요”라는 인삿말로 맺음하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 같이 만나 추석을 지내지는 못하여도 이렇게 전화라도 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다짐한다.
영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추석 명절이나 제사는 우리 문화에 잘 어울린다. 설, 추석, 제사라는 관례를 치르면서 선조들을 생각하여 보고 우리의 뿌리를 다시 살펴보고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다짐하게 한다. 또 명절과 제사는 흩어져 사는 형제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므로 메말라 가는 세파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준다. 추석날 아침이 즐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