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문학에 나타난 주류언어의 사용과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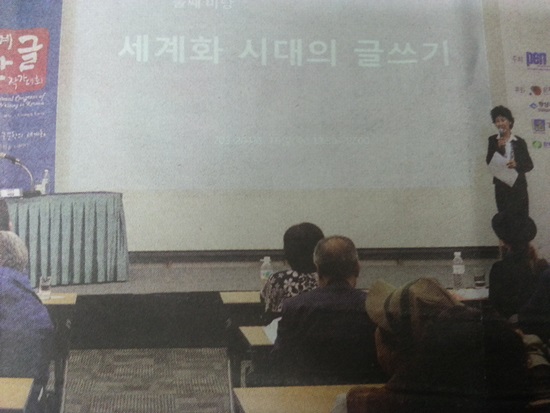
미국정부는 이민자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각 지역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영어선생님을 파견해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는 물론, 역사, 지리 수학 등 고등학교 수업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성인 교육(Adult schoo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ult school은 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 그 전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동한 Diploma라고 하는 수료증을 주고 원하는 대학의 편입과 직업 알선에 도움을 주는 봉사 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 1세 대부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 별을 보고 일터로 나갔다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힘든 노동에 시달리느라 주어진 황금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전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한국 기업들도 이곳에 진출해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덕으로 EI Camino Real(옛날 멕시코 왕족만이 거닐던 거리였다고 함) 거리에는 한국 식당과 부동산, 식료품점 등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영어로 간판보다 더 많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처음 발을 붙일 때인 38년 전만해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동족이 너무 그리워 거리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 혹은 다른 동양인을 만나면 반가워 한참을 끌어안고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후반부터 전자회사의 붐이 일어나면서 영어는 잘 못해도 부지런함과 근면함, 또한 뛰어난 솜씨가 알려져 다른 도시에서 몰려든 한국인들의 둥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인들은 보험업계의 일로, 남편들은 세탁소와 주류 판매점(Li-quor store)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를 많이 운영하였는데, 어떤 분은 기본적인 영어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손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나마도 body language로 소통을 하려다가 보니 코미디언처럼 희노애락을 겪으며 고달픈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민 1세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말도 잊어가고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주어동사가 빠진 영어가, 혀를 꾸부리기도 힘든데, 불쑥불쑥 튀어나와 자신도 놀란다고 하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See you tomorrow, Let's go together, Oh my God, Jesus Christ, Enjoy, Have a nice day, Honey, Wife, Darling 등. 1976년, 한인사회가 아직 이곳에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을 때,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영주권도 없이 밑바닥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어렵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은발의 월버 목사님과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회를 창립한 목사님, 그 두 분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임금이 2달러 5센트, 한국 돈으로 2,300원, 저는 전자회사의 말단 공원, 청소부와 꽃집,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빈털터리였던 저는 제 은행계좌에 조금씩 달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이민 보따리에 싸 들고 온 200자 원고지 1800매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4년여 만에 “양지와 음지”라는 제목의 글을, 주간지 선데이 토픽 김동열 사장님께서 ‘아메리카 아리랑’으로 제목을 바꿔 처음으로 신문에 연재하는 행운을 안게 됐습니다.
뜻밖에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장장 2년 6개월여 동안 제 글이 신문에 연재되면서 함께 울고 웃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 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문학 동호회를 만들자는 많은 제의도 받았습니다.
쉽게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던 때에 한미 봉사회 관장으로 계셨던 분으로부터 방 하나를 얻어 실리콘밸리 롸이더스그룹(Writer's Group)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모두가 30,40대의 직장인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낯선 나라의 고단한 삶에 대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어, 이 땅에서 받은 설움,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 고달프고 외로운 우리들의 삶과 한을 토대로 진솔한 글을 썼습니다. 또한 한국 작가들의 좋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면서 먼 조국을 그려보고, 잊혀져가는 동요를 부르며 울고 웃으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고는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신아 출판사 서정환 사장님의 배려로 마흔다섯 분들의 글들을 중견작가들의 기고로 함께 모아 ‘아메리카 아리랑’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담은 사진과 글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엎어지고 콧등이 깨져도 다시 일어나서 꿋꿋이 버티며 살아온 우리네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서야 할 땅을 찾기까지의 한 맺힌 사연들을 담은 ‘아메리카 아리랑’의 출판 기념회는 그렇게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두 번째 문학집을 출간하고 또 다시 세 번째 문학집을 준비하면서 세월에 등 떠밀린 회원들의 나이가 벌써 60대, 70대 혹은 80에 접어들게 되자 숨어있던 복병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이곳저곳에서 세포가 우지끈, 와지끈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생존하는 날까지, 자신의 자서전에 한을 담아 토해내겠노라고 하는 회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문단의 거목이라고 하시는 분이 북가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실리콘벨리 롸이더스그룹 주최로 그분을 모시고 문학의 밤을 열어 환영식 겸 특강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끔 미국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책을 받아보면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의 문장보다는 영어문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던,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꼭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40여 년 동안 몇 곳의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도서관을 오고 가며 본 책들, TV를 보면서 귀로 익힌 영어를 통해 생활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을 뿐인데 글을 쓸 때 어떤 제목이나 문장은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저도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사회의 문화와 삶에 어느새 적응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소설이나 수필과 시를 들추어 보면 제목이나 내용에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필인 경우에 American by choice, not by chance. Target. Happy New Year, You made my day. Forgive, Disaster, Sexy Seventy. Driving test, Standin at the Crossroads of Dusk 등등이 있고, 소설 중간, 중간에 Time flies, Sophisticated Lady. Foxy lady, Wonderful, Benefit, Oh my god! Beautiful, Relax, I miss you, Charming, She or He makes me nuts. Love 등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백지이면서도 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라 쉽게 이런 단어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한글 보다 영어가 제 마음을 더 쉽게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이민생활로 아름다운 한글이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조금씩 잊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저의 국적은 미국인입니다만 내가 자란 나라 한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또 우리의 혼이 담긴 한글을 항상 사랑해왔습니다. 13년 전에 주머니를 털어 2세들에게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한글학교 협의회에 박은주 새싹 문학회를 만들었고, 그 어려운 와중에 28년 전에 만든 실리콘밸리 롸이더스그룹을 통해 육아수기 공모도 14년째 연례행사로 하고 있을 만큼 한글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앞으로 글을 쓸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되도록 영어를 줄여 아름다운 우리나라 글을 찾아 다듬어가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기는 싫어도 세월에 등 떠밀려 먹어가는 나이로 40,50대의 나이에 ‘실리콘 밸리 롸이더스 그룹’의 간판을 단 지도 어언 30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쳐들어와 세포가 우지끈 와지끈 무너져 병실에 계시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를 못 넘기고 가신 분, 눈앞이 가려 운전대를 놓아야 했고, 귀가 어둡고 당뇨로, 관절로, 회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인들은 후계자 양성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살기에는 편해진 문명의 이기에 도취되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이 세계의 지도자로 둔갑되어 이재가 밝아지고 사랑이 심어져야 할 가슴에 계산기를 심고 사는 삶의 장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나라사랑, 한글사랑을 격하게 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750만 해외동포들 특히 우리 노인네들이 함께 느끼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민 1세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사랑, 한글사랑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교민들의 경제와 언어의 빈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 본 기사는 '미주주간현대' 2015년 11월 12일자 기사 내용을 발췌 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